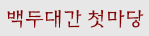백두대간 사람들 2 무산 - 철책에 갖힌 강, 남강은 그래도 흐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강 댓글 0건 조회 216,801회 작성일 18-08-28 12:35본문
백두대간의 땅 사랑은 편파적이다. 동해 만경창파 수 억의 골과 능선에 대한 시샘인지 동쪽으로는 강이라 부를 만한 물줄기를 터주지 않는다. 이러한 대간이 금강산 1만2천봉을 빚느라 지쳤는지 금강산 남쪽 거대한 육산 무산(1,319m)을 빚고는 그 옆으로 제법 큰 물줄기를 터주었다. 이 줄기가 동북으로 뻗은 향로봉 산줄기에 기대며 동해를 향해 200여리 물길을 이어가는 남강이다.
봄에는 황어가 가을에는 연어가
남강은 고성군에서 가장 넓은 면이었던 수동면 한가운데를 지나며 산의 퇴적물을 실어 날라와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강이었다. “참 살기 좋은 곳이야. 물 맑지 산 깊지 농사 잘되지 부족한 게 없었어.” 수동면민회 이부익(72) 회장은 기억을 더듬는다. 그러나 그의 기억은 월남하던 1951년에서 박제된 채 한치도 나가지 못한다. 남강의 남쪽은 비록 수복됐다고는 하지만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이다. 자랑스런 왕가의 혈통을 물려준 조상들의 선산이 그곳에 있지만 50여년을 한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다. 나라가 갈리고, 강원도가 갈리고, 고성군이 갈리고, 수동면이 갈리고, 그리고 이 회장의 고향인 사비리까지 남강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갈려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남강은 철저하게 분단의 상징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봄이 오면 강이 눈 녹은 물로 홍수를 이루곤 했지. 눈이 한번 왔다 하면 한길을 금방 넘었지. 한식무렵이면 눈 녹은 물에 홍수 진 강을 타고 동해에서 황어가 올라와.” 이 회장의 기억속에서 남강은 해산물을 공급하던 창고였다. 봄이면 황어와 은어가, 여름이면 송어와 칠성장어가, 서리가 내릴 무렵이면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은어는 연어 떼를 헤치며 바다로 가곤 했다. 남동쪽으로 향로봉 산맥과 북서쪽으로는 무산, 두무산. 남강은 그 사이를 흘렀다. 강에 물을 대는 수없이 많은 골짜기는 열목어니 산천어가 지천이었다. 겨울 남강에 어름이 지면 그대로 썰매장이자 스케이트장이었다.
한길이 넘는 눈 속을 헤매다 동네까지 내려오는 멧돼지를 기다리며 청년들은 겨우내 창의 날을 세우곤 했다. 가끔씩 누구누구가 곰을 잡았다더라하는 이야기라도 전해지는 날에는 온 동리의 사랑방마다 밤이 이슥하도록 호롱불이 꺼지지 않았다. 식민지 통치가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일본의 공출이 혹독했지만 땅이 비옥해 소출이 넉넉한지라 인심은 변하지 않았다. “봄이면 ‘갈’을 논에다 뿌렸는데. 갈 베는 일을 그 사람들이 많이 했어. 왜 도토리나무 어린 것들을 우리는 갈이라고 했어. 퇴비로 주곤 했지만 주로 논에는 갈을 많이 멕였지.” 봄이면 삼칭령(지도에는 삼재령)을 넘어 인제 양구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견디다 못해 품을 팔러 왔다. 일손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건만 수동면 사람들은 그들을 마다지 않았다. 며칠이곤 갈을 베던 그들이 다시 삼칭령을 넘을 때면 손에는 쌀자루가 들리게 마련이었다.
동경제국대학의 연습림과 닉켈 광산
남강 양 옆의 두무산 줄기와 향로봉 줄기의 울창한 산림 덕에 수동면은 교육열 높기가 고성군에서 1등이었다고 한다. “당시 동경제국대학 농학부 연습림이 수동면에 있었거든. 신대리와 고미성리에 출장소가 있었지. 여름이면 동경제대 학생들이 많이 왔어. 그 모습에 어른들이 자극을 많이 받았어. 넉넉했다곤 하지만 빤한 게 시골살림이야. 그래도 자식들 공부는 참 열심히 시켰지.” 소학교가 5개에 이르고 면소재지 가운데는 드물게 수동중학교가 일찌감치 세워졌다. 당시 고성군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은 면이 수동면이었다는 이 회장의 자랑이다.
당시 동경제대의 마을사람 길들이기는 독특했다. “그때도 우리들은 밀감을 먹었어. 양력 새해와 천황의 생일인 4월29일이면 자기네 출장소가 있던 고미성리의 수동소학교 학생들에겐 밀감을 하나씩 나눠줬어. 수학여행 갈 때는 단체복도 맞춰주고….” 아이들에게 잘해줘야 동네사람들이 연습림을 잘 지켜줄 것 아니냐는 속셈이 깔린 선물이었다.
그러나 온 산에 빼곡했던 아름드리 적송은 1930년대 중반부터 베어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남강에 ‘동’(나무기둥)으로 보를 만들어 물을 모아놓고 베어낸 적송들을 모았다가 보를 터뜨려 나무를 하류 쪽인 고성으로 실어 날랐다. 일부는 일본 본토의 건축자재로, 일부는 당시 한창이던 철도 부설 공사의 침목으로 땅에 깔리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벌목은 ‘인공시절’까지도 이어졌다. 그 울창하던 적송 숲은 그렇게 축나기 시작했고 한국전쟁의 참혹한 폭격을 견뎌내지 못했다.
일제는 중일전쟁(1937∼45) 이후 남강 상류지역인 사천리와 면 소재지였던 신대리 인근의 형제고개 등지에 닉켈 광산을 개발했다. 비행기 동체로 쓰이는 쇠를 얻기 위해서였다. 지금의 7번국도가 지나는 통일전망대 바로 넘어 초구에서 사천리를 잇는 국도가 개설되고 트럭과 우마차를 이용해 닉켈은 흥남제철소로 날라졌다. 일제는 닉켈 채광을 본격화하기 위해 고성부터 사천리를 연결하는 철도를 부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기초 측량조사까지 마쳤지만 패망으로 그 뜻은 이루지 못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몇몇 광산업자들이 닉켈 채굴을 몇 번 시도했을 정도로 남강 일대의 닉켈 매장량은 엄청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전쟁의 포성은 멎었다. 남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른다. 그러나 잔뜩 날 세운 철조망이 빼곡하던 적송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경비초소의 유효사거리 내에 있는 남강주변은 군인들에도 요주의 지역이다. 남강에 물을 대던 향로봉산맥의 수많은 골짜기들에도 인적이 막힌지 반 백년이 다 돼간다. 지난 85년 강원일보사 주최로 이뤄진 민통선 학술조사로 남강의 지류인 고진동 계곡의 모습이 세간에 알려진 것이 고작이다. 지금은 군인들의 감시를 피해 간간이 산을 드나드는 약초꾼들의 입으로 남강의 모습이 전해질 뿐이다. 남과 북 모두가 갈 수 없는 땅 수동면에서 남강은 그렇게 한줄기 바람처럼 기억의 저편으로 흘러가고 있다.
출처: http://100mt.tistory.com/entry/백두대간-사람들-2-무산-철책에-갖힌-강-남강은-그래도-흐른다 [<한겨레21> 신 백두대간 기행 블로그]
봄에는 황어가 가을에는 연어가
남강은 고성군에서 가장 넓은 면이었던 수동면 한가운데를 지나며 산의 퇴적물을 실어 날라와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강이었다. “참 살기 좋은 곳이야. 물 맑지 산 깊지 농사 잘되지 부족한 게 없었어.” 수동면민회 이부익(72) 회장은 기억을 더듬는다. 그러나 그의 기억은 월남하던 1951년에서 박제된 채 한치도 나가지 못한다. 남강의 남쪽은 비록 수복됐다고는 하지만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이다. 자랑스런 왕가의 혈통을 물려준 조상들의 선산이 그곳에 있지만 50여년을 한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다. 나라가 갈리고, 강원도가 갈리고, 고성군이 갈리고, 수동면이 갈리고, 그리고 이 회장의 고향인 사비리까지 남강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갈려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남강은 철저하게 분단의 상징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봄이 오면 강이 눈 녹은 물로 홍수를 이루곤 했지. 눈이 한번 왔다 하면 한길을 금방 넘었지. 한식무렵이면 눈 녹은 물에 홍수 진 강을 타고 동해에서 황어가 올라와.” 이 회장의 기억속에서 남강은 해산물을 공급하던 창고였다. 봄이면 황어와 은어가, 여름이면 송어와 칠성장어가, 서리가 내릴 무렵이면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은어는 연어 떼를 헤치며 바다로 가곤 했다. 남동쪽으로 향로봉 산맥과 북서쪽으로는 무산, 두무산. 남강은 그 사이를 흘렀다. 강에 물을 대는 수없이 많은 골짜기는 열목어니 산천어가 지천이었다. 겨울 남강에 어름이 지면 그대로 썰매장이자 스케이트장이었다.
한길이 넘는 눈 속을 헤매다 동네까지 내려오는 멧돼지를 기다리며 청년들은 겨우내 창의 날을 세우곤 했다. 가끔씩 누구누구가 곰을 잡았다더라하는 이야기라도 전해지는 날에는 온 동리의 사랑방마다 밤이 이슥하도록 호롱불이 꺼지지 않았다. 식민지 통치가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일본의 공출이 혹독했지만 땅이 비옥해 소출이 넉넉한지라 인심은 변하지 않았다. “봄이면 ‘갈’을 논에다 뿌렸는데. 갈 베는 일을 그 사람들이 많이 했어. 왜 도토리나무 어린 것들을 우리는 갈이라고 했어. 퇴비로 주곤 했지만 주로 논에는 갈을 많이 멕였지.” 봄이면 삼칭령(지도에는 삼재령)을 넘어 인제 양구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견디다 못해 품을 팔러 왔다. 일손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건만 수동면 사람들은 그들을 마다지 않았다. 며칠이곤 갈을 베던 그들이 다시 삼칭령을 넘을 때면 손에는 쌀자루가 들리게 마련이었다.
동경제국대학의 연습림과 닉켈 광산
남강 양 옆의 두무산 줄기와 향로봉 줄기의 울창한 산림 덕에 수동면은 교육열 높기가 고성군에서 1등이었다고 한다. “당시 동경제국대학 농학부 연습림이 수동면에 있었거든. 신대리와 고미성리에 출장소가 있었지. 여름이면 동경제대 학생들이 많이 왔어. 그 모습에 어른들이 자극을 많이 받았어. 넉넉했다곤 하지만 빤한 게 시골살림이야. 그래도 자식들 공부는 참 열심히 시켰지.” 소학교가 5개에 이르고 면소재지 가운데는 드물게 수동중학교가 일찌감치 세워졌다. 당시 고성군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은 면이 수동면이었다는 이 회장의 자랑이다.
당시 동경제대의 마을사람 길들이기는 독특했다. “그때도 우리들은 밀감을 먹었어. 양력 새해와 천황의 생일인 4월29일이면 자기네 출장소가 있던 고미성리의 수동소학교 학생들에겐 밀감을 하나씩 나눠줬어. 수학여행 갈 때는 단체복도 맞춰주고….” 아이들에게 잘해줘야 동네사람들이 연습림을 잘 지켜줄 것 아니냐는 속셈이 깔린 선물이었다.
그러나 온 산에 빼곡했던 아름드리 적송은 1930년대 중반부터 베어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남강에 ‘동’(나무기둥)으로 보를 만들어 물을 모아놓고 베어낸 적송들을 모았다가 보를 터뜨려 나무를 하류 쪽인 고성으로 실어 날랐다. 일부는 일본 본토의 건축자재로, 일부는 당시 한창이던 철도 부설 공사의 침목으로 땅에 깔리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벌목은 ‘인공시절’까지도 이어졌다. 그 울창하던 적송 숲은 그렇게 축나기 시작했고 한국전쟁의 참혹한 폭격을 견뎌내지 못했다.
일제는 중일전쟁(1937∼45) 이후 남강 상류지역인 사천리와 면 소재지였던 신대리 인근의 형제고개 등지에 닉켈 광산을 개발했다. 비행기 동체로 쓰이는 쇠를 얻기 위해서였다. 지금의 7번국도가 지나는 통일전망대 바로 넘어 초구에서 사천리를 잇는 국도가 개설되고 트럭과 우마차를 이용해 닉켈은 흥남제철소로 날라졌다. 일제는 닉켈 채광을 본격화하기 위해 고성부터 사천리를 연결하는 철도를 부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기초 측량조사까지 마쳤지만 패망으로 그 뜻은 이루지 못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몇몇 광산업자들이 닉켈 채굴을 몇 번 시도했을 정도로 남강 일대의 닉켈 매장량은 엄청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전쟁의 포성은 멎었다. 남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른다. 그러나 잔뜩 날 세운 철조망이 빼곡하던 적송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경비초소의 유효사거리 내에 있는 남강주변은 군인들에도 요주의 지역이다. 남강에 물을 대던 향로봉산맥의 수많은 골짜기들에도 인적이 막힌지 반 백년이 다 돼간다. 지난 85년 강원일보사 주최로 이뤄진 민통선 학술조사로 남강의 지류인 고진동 계곡의 모습이 세간에 알려진 것이 고작이다. 지금은 군인들의 감시를 피해 간간이 산을 드나드는 약초꾼들의 입으로 남강의 모습이 전해질 뿐이다. 남과 북 모두가 갈 수 없는 땅 수동면에서 남강은 그렇게 한줄기 바람처럼 기억의 저편으로 흘러가고 있다.
출처: http://100mt.tistory.com/entry/백두대간-사람들-2-무산-철책에-갖힌-강-남강은-그래도-흐른다 [<한겨레21> 신 백두대간 기행 블로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