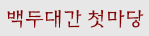백두대간 사람들 15 대관령 목장; 6월이면 초록빛 바다의 황홀한 유혹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강 댓글 0건 조회 250,301회 작성일 18-08-28 12:20본문
김수영 시인은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서며 바람보다 빨리 웃는다’고 풀을 노래했다. 그러나 삼양축산 대관령목장의 풀들은 겨울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하얀 눈 이불을 뒤덮은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고개 넘어 바닷가 강릉 경포대에는 벚꽃축제를 알리는 오색등이 화려하게 점멸하지만, 대관령목장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평균 해발 1천m가 넘는 고원지대입니다. 6월6일 현충일에 눈이 내린 적도 있습니다.” 20여년 청춘을 목장에 바쳤다는 배성룡(46) 목장장은 “설악산 공룡능선에 단풍이 들 때쯤이면 겨울채비를 해야 하고 푸른빛은 6월이나 돼야 찾아든다”고 말한다. 그만큼 대관령목장은 겨울이 일찍 찾아오고 늦게 떠난다.
대관령목장을 찾는 이들은 제일 먼저 엄청난 규모에 놀란다. 총면적 600여만평. 서울 여의도의 7.5배이고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5000의 규모다. 눈앞에 펼쳐지는 전경은 광대하다는 말로는 부족함을 느낀다.
오대산에서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주능선의 소황병산 매봉 곤신봉 선자령 등이 대관령목장의 울타리 안에 들어 있다. 목장을 한바퀴 도는 순환도로만 22km이고, 목초를 운반하고 소들을 돌보기 위한 작업도로까지 합하면 도로 길이는 120km에 이른다.
이 엄청난 목장의 출발은 라면에서 비롯됐다. “삼양식품 전중윤 회장의 고집이 이뤄놓은 작품입니다. 겨울이 긴 고원에서 무슨 목장이냐는 반대를 무릅쓰고 10여년에 걸쳐 목장을 일궜죠.” 라면 하나로 삼양이란 이름을 세우는 데 성공한 전 회장은 다른 기업들이 사업다각화를 내걸고 문어발을 키울 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수군거림을 뒤로 돌리고 목장에 손을 댔다고 한다. 같은 강원도 사람들도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혀를 찰 만큼 궁벽진 산골 횡계에 축산부국의 야심찬 꿈의 첫 삽은 1972년에 꽂혔다. 하늘을 가리던 참나무숲이 한 평 두 평 초지로 바뀌는 데는 10여년이 걸렸다. 그러고도 우사를 짓고 목부들이 머물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는 몇 년이 더 흘러야 했다. 목장의 현재 모습은 85년에야 완공된 것이다.
목장이 모습을 갖춰가면서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충남의 서산목장, 제주도의 제동목장, 경기도의 안성목장 등이 대관령목장의 뒤를 이었다. ‘축산부국’의 중추적 인재를 기르기 위한 축산고등학교가 74년 문을 열기도 했다. 불가능하리라던 예상을 뒤엎고 목초는 잘 자라 주었다. 미국산 풀씨 리드 카나리아는 여름이면 능선을 뒤덮는 안개로 목을 축이고 겨울이면 엄청난 눈에 뒤덮여 추위를 견뎌 주었다.
“목장 초창기에는 육우 생산에 주력했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쇠고기들은 쇠고기라면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원료가 돼주었다. 그러나 ‘산은 단백질원이다. 목초는 곧 고기와 우유다’라는 구호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들여오는 수입산 쇠고기의 저가 공격을 당해낼 수 없었다. 육우는 젖소로 바뀌었다. ‘신선한 대관령 고원우유’가 광고를 타기 시작한 것은 곧 대관령목장의 내리막을 예고한 것이었다. 누적되는 적자는 초창기에 3500두에 이르던 소의 숫자가 1500두로 줄더니 IMF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은 700두의 젖소만이 간신히 목장의 명맥을 이어갈 뿐이다.
소도 줄고 기계화가 진행된 탓도 크지만, 한때 350여명에 이르던 목부들도 이제는 31명만이 남아 있다. “길어야 몇 달입니다. 도무지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축산업에 인생을 걸 각오를 다지고 일을 배울 겸 오는 이들도 서너달만 이곳에서 지내면 이내 보따리를 싸버린다는 설명이다. 코를 쥐어잡게 만드는 소똥냄새와 목초 발효냄새, 새벽부터 밤늦도록 이어지는 소 뒤치다꺼리를 견기기엔 요즘 사람들의 인내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만 같다고 목장장 배씨는 혀를 찬다.
남아 있는 목부들은 자신의 신상을 밝히기를 무척 꺼려했다. 목장이나 소에 대한 질문에는 친절하게 대답을 하다가도 이름을 물어보면 이내 얼굴표정이 굳어진다. 질문이 계속되면 고개를 돌린 채 그저 큰 눈을 끔벅거리는 소의 등을 어루만질 뿐이다. 소에게 풀을 먹이던 50대쯤 되는 목부는 마지 못해 카메라 앞에 서면서도 등만 찍으라고 자꾸만 고개를 외로 돌린다. “나도 한때는 중견 기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미처 맺지 못한 말이 소의 울음과 묘하게 뒤섞여 버린다. 목장입구에 세워진 ‘개척정신’도, ‘목초는 곧 고기와 우유다’라는 구호에 담긴 자긍심도 그들에겐 남의 일일 뿐이다. 배 목장장은 하나뿐인 축산고등학교의 간판까지도 내릴 수밖에 없는 암울한 축산업의 미래가 꿈을 주지 못하는 탓으로 돌렸다.
소들이 줄어들면서 목장의 드넓은 초원에는 새 손님들이 찾아들고 있다. 워낙 넓은 탓에 1년이 가도록 소의 발자국이 한번도 지나지 않는 초지가 도처에 널려 있다. 이런 곳에는 어김없이 들꽂들이 찾아든다. 봄이면 남획으로 귀해지는 얼레지가 지천이고 가을 구절초는 군락까지 이룬다 했다. 소들의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 조성해놓은 삼정호에는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아예 텃새로 들어앉았다.
초기에는 전염병이 번질 것에 대한 걱정과 목초지 보호를 위해 일체 금했던 외부인의 방문도 90년대 들어서부터 특별한 때가 아니면 막지 않는다. 목장의 울타리를 따라 난 백두대간 능선에 종주산행의 발길이 잦아지고 대관령목장의 뛰어난 경관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지난해에만도 이곳을 찾아온 사람이 3만여명을 넘어설 정도로 관광객들은 점차 늘고 있다. 만발하는 봄의 들꽃과 여름의 장대한 초록빛 바다, 가을에는 황금빛 고원에 뛰어노는 메뚜기떼와 아름다운 황병산의 단풍이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것이다. 겨울에는 구릉을 오르내리며 눈썰매 타는 것이 관광회사의 연례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어느 계절도 좋지요. 20여년 사진을 찍어 오면서도 아직도 새로운 게 목장의 경치입니다.” 사진작가이기도 한 목장장 배씨는 축산부국의 기치를 세웠던 대관령목장이 관광목장으로의 변신을 해서라도 명맥을 이어가기 바라고 있다.
사실 이곳은 관광지로 탈바꿈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별다른 시설을 따로 하지 않아도 텅빈 사원용 아파트와 삼양식품 연수원은 그대로 광광객의 숙소가 될 수 있다. 다른 편의시설도 조금만 손질하면 손님을 맞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관광목장은 아직은 배 목장장의 꿈일 뿐이다. 초지법이 초지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의 시설물을 목장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초지가 조성된 뒤인 75년 국립공원에 편입된 250만평의 부지도 국립공원법에 묶여 있어 초지 생산을 위한 도로마저 낼 수 없는 형편이다. 관광촉진지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가슴이 부풀기도 했지만 이런 제한들을 풀어줄 후속조치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연중 바람이 그치지 않는 능선에 풍력발전기를 세워 한국전력에 전기를 납품한다는 계획도 관광목장과 맞닿아 있다. “94년에 능선에 발전기가 들어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닌데 경제성은 입증됐지요.” 미국 출장길에서 본 캘리포니아의 풍력발전소가 배 목장장이 그리는 대관령 풍력발전소의 모습이다. 자신이 찍은 사진으로 그림엽서 견본을 만들고, 목장의 풍광을 담은 CD-ROM을 제작하는 등 배씨는 대관령목장의 중흥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지우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한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현대에서 언제 목장이 다시 제 기능을 할지 모르는데 목장문을 닫을 수는 없다는 바람이 큰 탓이다.
“여름에 한번 오십시오. 옷을 벗어던지고 뛰어들라는 초록빛 바다의 유혹을 이기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목초는 소들의 밥상이니 함부로 짓밟지 말아 달라는 것이 그의 당부이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줄리 앤드루스가 아이들과 함께 도레미송을 부르며 오르는 알프스 신록을 떠올린다는 아름다운 경치지만 배 목장장에게는 아직도 축산부국의 소중한 꿈이 담겨 있는 탓이다
출처: http://100mt.tistory.com/entry/백두대간-사람들-15-대관령-목장-6월이면-초록빛-바다의-황홀한-유혹이 [<한겨레21> 신 백두대간 기행 블로그]
“평균 해발 1천m가 넘는 고원지대입니다. 6월6일 현충일에 눈이 내린 적도 있습니다.” 20여년 청춘을 목장에 바쳤다는 배성룡(46) 목장장은 “설악산 공룡능선에 단풍이 들 때쯤이면 겨울채비를 해야 하고 푸른빛은 6월이나 돼야 찾아든다”고 말한다. 그만큼 대관령목장은 겨울이 일찍 찾아오고 늦게 떠난다.
대관령목장을 찾는 이들은 제일 먼저 엄청난 규모에 놀란다. 총면적 600여만평. 서울 여의도의 7.5배이고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5000의 규모다. 눈앞에 펼쳐지는 전경은 광대하다는 말로는 부족함을 느낀다.
오대산에서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주능선의 소황병산 매봉 곤신봉 선자령 등이 대관령목장의 울타리 안에 들어 있다. 목장을 한바퀴 도는 순환도로만 22km이고, 목초를 운반하고 소들을 돌보기 위한 작업도로까지 합하면 도로 길이는 120km에 이른다.
이 엄청난 목장의 출발은 라면에서 비롯됐다. “삼양식품 전중윤 회장의 고집이 이뤄놓은 작품입니다. 겨울이 긴 고원에서 무슨 목장이냐는 반대를 무릅쓰고 10여년에 걸쳐 목장을 일궜죠.” 라면 하나로 삼양이란 이름을 세우는 데 성공한 전 회장은 다른 기업들이 사업다각화를 내걸고 문어발을 키울 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수군거림을 뒤로 돌리고 목장에 손을 댔다고 한다. 같은 강원도 사람들도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혀를 찰 만큼 궁벽진 산골 횡계에 축산부국의 야심찬 꿈의 첫 삽은 1972년에 꽂혔다. 하늘을 가리던 참나무숲이 한 평 두 평 초지로 바뀌는 데는 10여년이 걸렸다. 그러고도 우사를 짓고 목부들이 머물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는 몇 년이 더 흘러야 했다. 목장의 현재 모습은 85년에야 완공된 것이다.
목장이 모습을 갖춰가면서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충남의 서산목장, 제주도의 제동목장, 경기도의 안성목장 등이 대관령목장의 뒤를 이었다. ‘축산부국’의 중추적 인재를 기르기 위한 축산고등학교가 74년 문을 열기도 했다. 불가능하리라던 예상을 뒤엎고 목초는 잘 자라 주었다. 미국산 풀씨 리드 카나리아는 여름이면 능선을 뒤덮는 안개로 목을 축이고 겨울이면 엄청난 눈에 뒤덮여 추위를 견뎌 주었다.
“목장 초창기에는 육우 생산에 주력했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쇠고기들은 쇠고기라면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원료가 돼주었다. 그러나 ‘산은 단백질원이다. 목초는 곧 고기와 우유다’라는 구호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들여오는 수입산 쇠고기의 저가 공격을 당해낼 수 없었다. 육우는 젖소로 바뀌었다. ‘신선한 대관령 고원우유’가 광고를 타기 시작한 것은 곧 대관령목장의 내리막을 예고한 것이었다. 누적되는 적자는 초창기에 3500두에 이르던 소의 숫자가 1500두로 줄더니 IMF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은 700두의 젖소만이 간신히 목장의 명맥을 이어갈 뿐이다.
소도 줄고 기계화가 진행된 탓도 크지만, 한때 350여명에 이르던 목부들도 이제는 31명만이 남아 있다. “길어야 몇 달입니다. 도무지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축산업에 인생을 걸 각오를 다지고 일을 배울 겸 오는 이들도 서너달만 이곳에서 지내면 이내 보따리를 싸버린다는 설명이다. 코를 쥐어잡게 만드는 소똥냄새와 목초 발효냄새, 새벽부터 밤늦도록 이어지는 소 뒤치다꺼리를 견기기엔 요즘 사람들의 인내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만 같다고 목장장 배씨는 혀를 찬다.
남아 있는 목부들은 자신의 신상을 밝히기를 무척 꺼려했다. 목장이나 소에 대한 질문에는 친절하게 대답을 하다가도 이름을 물어보면 이내 얼굴표정이 굳어진다. 질문이 계속되면 고개를 돌린 채 그저 큰 눈을 끔벅거리는 소의 등을 어루만질 뿐이다. 소에게 풀을 먹이던 50대쯤 되는 목부는 마지 못해 카메라 앞에 서면서도 등만 찍으라고 자꾸만 고개를 외로 돌린다. “나도 한때는 중견 기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미처 맺지 못한 말이 소의 울음과 묘하게 뒤섞여 버린다. 목장입구에 세워진 ‘개척정신’도, ‘목초는 곧 고기와 우유다’라는 구호에 담긴 자긍심도 그들에겐 남의 일일 뿐이다. 배 목장장은 하나뿐인 축산고등학교의 간판까지도 내릴 수밖에 없는 암울한 축산업의 미래가 꿈을 주지 못하는 탓으로 돌렸다.
소들이 줄어들면서 목장의 드넓은 초원에는 새 손님들이 찾아들고 있다. 워낙 넓은 탓에 1년이 가도록 소의 발자국이 한번도 지나지 않는 초지가 도처에 널려 있다. 이런 곳에는 어김없이 들꽂들이 찾아든다. 봄이면 남획으로 귀해지는 얼레지가 지천이고 가을 구절초는 군락까지 이룬다 했다. 소들의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 조성해놓은 삼정호에는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아예 텃새로 들어앉았다.
초기에는 전염병이 번질 것에 대한 걱정과 목초지 보호를 위해 일체 금했던 외부인의 방문도 90년대 들어서부터 특별한 때가 아니면 막지 않는다. 목장의 울타리를 따라 난 백두대간 능선에 종주산행의 발길이 잦아지고 대관령목장의 뛰어난 경관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지난해에만도 이곳을 찾아온 사람이 3만여명을 넘어설 정도로 관광객들은 점차 늘고 있다. 만발하는 봄의 들꽃과 여름의 장대한 초록빛 바다, 가을에는 황금빛 고원에 뛰어노는 메뚜기떼와 아름다운 황병산의 단풍이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것이다. 겨울에는 구릉을 오르내리며 눈썰매 타는 것이 관광회사의 연례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어느 계절도 좋지요. 20여년 사진을 찍어 오면서도 아직도 새로운 게 목장의 경치입니다.” 사진작가이기도 한 목장장 배씨는 축산부국의 기치를 세웠던 대관령목장이 관광목장으로의 변신을 해서라도 명맥을 이어가기 바라고 있다.
사실 이곳은 관광지로 탈바꿈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별다른 시설을 따로 하지 않아도 텅빈 사원용 아파트와 삼양식품 연수원은 그대로 광광객의 숙소가 될 수 있다. 다른 편의시설도 조금만 손질하면 손님을 맞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관광목장은 아직은 배 목장장의 꿈일 뿐이다. 초지법이 초지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의 시설물을 목장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초지가 조성된 뒤인 75년 국립공원에 편입된 250만평의 부지도 국립공원법에 묶여 있어 초지 생산을 위한 도로마저 낼 수 없는 형편이다. 관광촉진지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가슴이 부풀기도 했지만 이런 제한들을 풀어줄 후속조치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연중 바람이 그치지 않는 능선에 풍력발전기를 세워 한국전력에 전기를 납품한다는 계획도 관광목장과 맞닿아 있다. “94년에 능선에 발전기가 들어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닌데 경제성은 입증됐지요.” 미국 출장길에서 본 캘리포니아의 풍력발전소가 배 목장장이 그리는 대관령 풍력발전소의 모습이다. 자신이 찍은 사진으로 그림엽서 견본을 만들고, 목장의 풍광을 담은 CD-ROM을 제작하는 등 배씨는 대관령목장의 중흥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지우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한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현대에서 언제 목장이 다시 제 기능을 할지 모르는데 목장문을 닫을 수는 없다는 바람이 큰 탓이다.
“여름에 한번 오십시오. 옷을 벗어던지고 뛰어들라는 초록빛 바다의 유혹을 이기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목초는 소들의 밥상이니 함부로 짓밟지 말아 달라는 것이 그의 당부이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줄리 앤드루스가 아이들과 함께 도레미송을 부르며 오르는 알프스 신록을 떠올린다는 아름다운 경치지만 배 목장장에게는 아직도 축산부국의 소중한 꿈이 담겨 있는 탓이다
출처: http://100mt.tistory.com/entry/백두대간-사람들-15-대관령-목장-6월이면-초록빛-바다의-황홀한-유혹이 [<한겨레21> 신 백두대간 기행 블로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